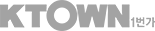- [내 마음의 隨筆] 문질빈빈(文質彬彬)으로 읽는 최립의 예술 세계 - 2 of 21002026.01.01
- [An Essay from My Heart] Reading Choi Rip’s Artistic World through Munjilbinbin (文質彬彬)1002026.01.01
- [내 마음의 隨筆] 명함 상자 앞에서 - 1 of 21432026.01.02
- [An Essay from My Heart] Before a Box of Business Cards752026.01.02
- [내 마음의 隨筆] 명함 상자 앞에서 - 2 of 21362026.01.02
[내 마음의 隨筆] 명함 상자 앞에서 - 1 of 2
2026.01.02[내 마음의 隨筆]
명함 상자 앞에서
책장 아래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모아온 명함들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이미 빛이 바랜 종이, 촉감이 남아 있는 활자, 손때가 묻은 모서리들. 명함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그 위에 적힌 시간은 이미 멀리 가 있었다.
명함을 한 장씩 꺼내며 나는 다시 사람들을 만났다.
함께 웃었던 얼굴,
긴 회의 끝에 나누었던 악수,
국경을 넘어 이어졌던 대화,
이제는 연락처가 바뀌었거나,
소식조차 알 수 없는 이름들.
명함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한 시절의 인간관계가 눌러 앉은 흔적이었다.
어떤 명함은 유난히 두꺼웠고, 어떤 것은 소박했다.
화려한 직함이 적힌 것도 있었고,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담담히 적힌 것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지금,
명함의 진짜 품격은 종이의 재질이나 디자인이 아니라
그 명함을 건네던 사람의 태도와 말의 온기에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조용히 귀를 기울이던 사람,
약속을 지키던 사람,
자기 이름을 책임지듯 살아가던 사람들.
그들의 명함은 오래 남아 마음속에서 여전히 선명하다.
명함을 넘기다 보면,
세월의 빠름과 야속함이 문득 가슴을 친다.
불과 몇 장을 넘겼을 뿐인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을까.
삶은 늘 단순할 것 같았지만,
돌아보면 언제나 복잡다단했고,
선택의 갈림길마다 작은 명함 한 장 같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리운 사람들의 명함 앞에서는 손길이 잠시 멈춘다.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이름도 있고,
어디선가 여전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을 이름도 있다.
연락하지 못한 미안함,
다시 만나지 못한 아쉬움이
종이 한 장 위에서 조용히 고개를 든다.
그러나 그리움은 후회가 아니라,
함께 살았던 시간에 대한 감사일지도 모른다.
나는 다시 명함을 상자에 넣으며 생각한다.
과거를 붙잡고 살 수는 없지만,
과거를 함부로 버릴 필요도 없다.
명함을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기억을 정돈하는 일이다.
그리고 기억을 정돈할 때에야
비로소 현재가 또렷해진다.







 Buy Nebutal (Pentobarbital) Online in Korea
Buy Nebutal (Pentobarbital) Online in Korea
 또 한 분께서▶◀심장마비로~
또 한 분께서▶◀심장마비로~
 433.“주옥 같은 아리아가 숨어 있는 오페라 이야기 속으로..”
433.“주옥 같은 아리아가 숨어 있는 오페라 이야기 속으로..”
 최고의 FX 솔루션 임대 | 카카오솔루션의 맞춤형 FX 거래 플랫폼
최고의 FX 솔루션 임대 | 카카오솔루션의 맞춤형 FX 거래 플랫폼
 비오는 날에~
비오는 날에~
 성악 교실
성악 교실